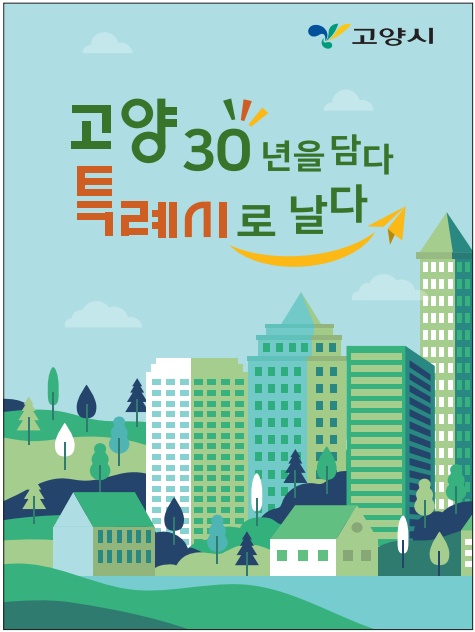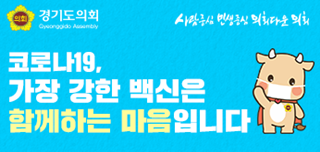순국선열 역사기행 [2020/09] 제주 해녀들이 뭉쳤던 이야기
페이지 정보
본문
끈질긴 생명력으로, 강인한 정신력으로
일제와 맞선 제주바다의 어멍들
글 | 강미경(시인, 여행작가)
제주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섬이다. 화려하기까지 하다. 언제나 가고 싶은 섬, 제주. 뭍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늘 동경하며 가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땅인데도 이국적이고 색다른 멋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 낭만을 찾아서, 때로 쉬고 싶어서 내려가는 곳. 그러나 수 없이 제주도를 오가면서도 그곳 여자들의 독특한 삶의 속내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제주도는 거센 바람이 많고, 논농사가 쉽지 않은 화산섬의 척박한 땅이다.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정네…. 그런 환경 속에서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제주 여인들은 삼국시대부터 독특한 일거리를 찾아냈다. 밭에서 밭농사를 하다가도 물때가 되면 한 달에 12일 정도는 바다에서 조업을 한다. 척박한 환경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 해녀들의 고단한 삶 1970년대 초에 고무 옷이 나오기 전까지는 면으로 된 해녀 복을 입었다. 눈 내리는 시린 겨울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2014년에도 해녀 두 명이 바닷물 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얼마 전 제주에 내려갔을 때 그곳 주민에게서 들은 말이다. 바다 속에서 채취할 것이 많으니 욕심을 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할 때를 놓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망사리를 채취물로 가득 채우려는 욕심. 태왁에 몸을 의지하며 물 밖에 머리를 내어 참았던 숨을 뱉어내며 숨비 소리(날숨소리)를 내어가면서 쉬엄쉬엄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 더 채취하려는 그들의 억척! 바다 햇살에 검게 그을린 그들의 주름 깊은 얼굴이 내 가슴을 짠하게 때려오는 것 같다. 수영을 할 줄 몰라 물을 무서워하는 내게는 생각만 해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것도 그들에게는 축복받은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도 제주 해녀는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해녀와 관련된 기록은 공물(貢物)인 전복을 바치기 위해 해녀들의 등골이 빠진다는 내용이 일색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그녀들이 받았던 수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과 민족적 차별에 적극 저항하다 또 해산물 채취 금지 기간에도 조업을 벌이면서 행패를 일삼았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다에 다니는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해녀들에게 조합에 가입을 하도록 강요했고, 가입비와 조합비 뿐 아니라 입어료, 지정판매제, 해조회사에 수수료, 뱃사람 임금, 소개인 사례비 등등을 떼이고 나면 생산자인 해녀의 몫은 2할 밖에 되지 않았다. 전복 한 마리에 1만원에 팔린다고 하면, 2,000원이 해녀의 몫인 것이다. 1930년에 성산포에서 우뭇가사리를 조합 서기가 입찰 가격보다 헐값으로 가로채려다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1931년에는 소라와 전복 수매 과정에서 저울눈을 속이다가 적발되어 제주 해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1932년 1월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일인(日人) 다구치 도사(島司)에게 전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빗창(전복을 채취할 때 쓰는 갈고리)과 호미를 들고 제주시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진군하면서 항쟁이 시작되었다. 부춘화(당시 25세), 김옥련(당시 23세), 부덕량(당시 22세)의 어린 해녀들이 대표가 되어 일으킨 시위였다. 그러나 이 일은 1931년 6월부터 미리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고, 1932년 1월 7일 세화리 장날 해녀 복을 입은 해녀들 300여명과 장터에 모인 민간인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대대적인 항쟁이었다. 이 일을 기화로 하여 해녀들의 항쟁은 3개월간 지속되었다. 1만 7천여 명이 참가하여 238차례에 걸쳐 우도를 비롯한 세화, 구좌, 성산 등의 해녀들이 뭉쳐 일어나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거세게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여성의 권리-생존권 쟁취 투쟁으로는 전국 최대의 규모였다. 이 일로 인해, 해녀 35명과 혁우 동맹 청년들을 포함하여 남자 43명이 검거되었다. 아름다운 제주의 이면에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다 얼마 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을 둘러보았을 때, 해녀들이 야학을 받는 모습의 인형을 보았었다. 해녀들에게 청년 지식인들이 야학을 가르치는 모습이 유리 상자 속에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었다.「농민독본」과 「노동독본」등의 계몽서를 가르치고 한글, 한문 뿐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을 가르쳤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뿐 아니라, 해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며 배움에 목말라 하는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1회 졸업생 중에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등이 해녀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해녀 항쟁에는 문도배, 한원택, 김순종, 오문규, 강관순, 고사만, 채재오 등의 도움으로 준비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을 포함한 43명의 남자들이 해녀들과 함께 검거된 것이다. 제주 시내에서 50분 정도 운전을 하여 찾아갔던 곳, 그곳을 불러보는 데는 서너 시간이 걸렸다. 짧은 시간 동안 제주 해녀들의 삶을 다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전시실의 절반이 해녀들의 항쟁에 대한 재료로 가득한 것을 보면, 제주 해녀들의 생존권을 울부짖는 항쟁이 곧 항일운동으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뜻한 날씨여야 하는 데도 바람이 심했고, 박물관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었다. 꽤 두껍게 입은 옷차림에도 한기가 느껴졌다.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와 단 둘뿐이어서 더욱 춥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불턱에서 불을 지펴 놓고 바닷물 속에서 얼었던 몸을 녹이고 있는 모형 인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혀 왔다. 불턱은 둥그렇게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해녀들이 잠수복을 갈아입는 곳이다. 물질(물 속 조업)을 하고 나와서 언 몸을 녹이며 해녀 회의를 했던 곳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삶의 고달픔 앞에서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저려왔다. 그들은 제주 해풍 속에서 한 여름에도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추워서 불턱에 불을 피워야 하는 바다의 여자들. 제주 해녀. 아픈 마음을 안고 박물관 마당으로 나와 보니, 해녀 항쟁 기념탑이 높게 세워져 있다. 약간은 비스듬한 언덕을 올라 그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해녀 노래」가 적혀 있는 노래비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해녀가 지었을 법한 해녀의 애환을 노래한 4절로 된 창가 같은 노랫말. 海女의 노래 1. 우리들은 가엾은 제주도의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도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2.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헤엄치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3.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각처 조선ㆍ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4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의 피와 땀을 작취하도다. 가엾는 우리 해녀 어데로 갈까. 해녀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애환을 몸소 느끼고 있던 스승이 지어 준 해녀의 노래. 육지에 소녀 유관순이 있었다면 제주 섬에는 청년 강관순(康寬順)이 있었다. 강관순이 출옥하여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북간도로 이주하던 도중 함경남도 청진에서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뼈아픈 이야기는 그가 지은 노랫말만큼이나 읽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쩌면 그 시대, 제주의 해녀들이나 야학을 하던 지식 청년들이나 모두 다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