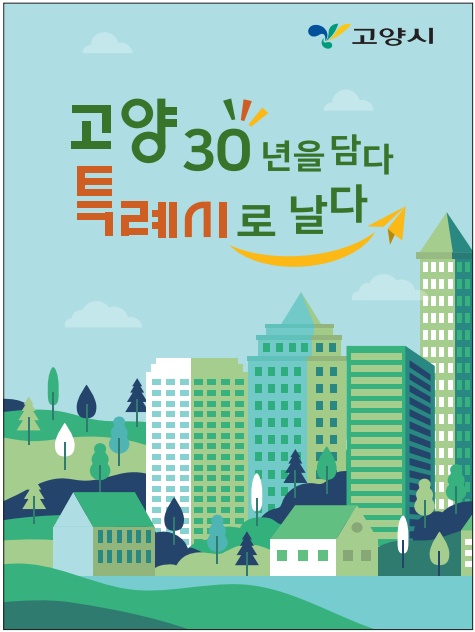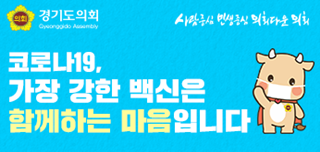잊혀져가는 역사를 다시 생각한다 [2022/07]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페이지 정보
본문
6백 년 근현대사 애환 켜켜이 쌓인 거대한 박물관
일제 총독 관저 터 자리한 ‘구중궁궐’
역사 품은 흔적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글 | 편집부 사진 | 한국관광공사·청와대·편집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요즘 가장 핫한 명소, 청와대의 주소다. 권력의 상징 ‘구중궁궐’에서 지난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래, 그야말로 매일매일 인산인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 개방 한 달 동안 77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조선 시대 경복궁 후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사로, 미 군정기에 사령관 관사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엔 대통령 집무실로 바뀌면서, 그사이 6백 년 근현대사의 애환이 청와대 구석구석에 켜켜이 쌓였다. 이 일대에 문화유산·유적도 61건에 이른다. 그야말로 거대한 근현대사 박물관이다. 수많은 인파와 더불어 굴곡진 역사 속을 거닐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여름으로 향해 가는 유월의 태양은 더없이 뜨거웠다. 파란 하늘 아래 파란 지붕이 북악산을 병풍 삼아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붐볐다. 여든 아흔 살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청와대 나들이에 나섰다. 뜨거운 햇볕, 기나긴 줄이 고될 터인데, 다들 설렌 표정이다. 살아생전 한번 와보고 싶었다며, 멀리 부산에서 목포에서 힘든 걸음 하셨단다. 청와대는 우리에게,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들에겐 더욱 각별한 공간이다. 분노와 절망, 슬픔과 연민, 긍지와 자부심이 뒤섞인 이곳을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쉼 없이 변화·발전해왔다.
외인들에 수난 겪은 비극의 공간
정부 수립 후 74년간 ‘구중궁궐’
청와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 태조 때 경복궁이 완성된 뒤, 세종 8년인 1426년 현재의 청와대 자리에 경복궁의 후원이 조성되었다. 이때 후원에는 서현정, 연무장, 과거 시험장이 만들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경복궁과 후원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그 후 27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고종 2년인 1865년 흥선대원군이 재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을 청사로 사용하면서 1939년 옛 후원 자리에 조선 총독의 관사를 지었다. 이후 관사 일대를 ‘경무대(景武臺)’라고 불렀다. 경복궁(景福宮)의 ‘경’ 자와 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의 ‘무’ 자에서 따온 이름이다. 미 군정기에는 사령관 관사로 사용되며 외인들에 의해 수난을 겪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에서 일제 총독 관저였던 경무대로 거처를 옮겼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썼다. 1960년 4·19혁명 분위기 속에 독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경무대의 이름을 바꾼 것. 이후 청와대는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4년간 일반 국민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왔다. 그런 까닭에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레드 카펫’ 중앙 계단 올라가면
첩첩한 고뇌의 시공간 펼쳐져

청와대는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 춘추관, 대통령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관을 중심으로 왼쪽에 영빈관이 있으며, 오른쪽에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이 있다.
무궁화동산 옆에 있는 영빈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18개의 돌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형태의 영빈관이 보인다.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행사를 열었던 건물이다.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북악산 아래 파란 지붕의 청와대 본관 건물이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본관은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된 중심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이 거주하던 곳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한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곳에 새로 지었다.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격조 높은 팔작지붕을 올리고 총 15만여 개의 청기와를 이었다. 본관 내부 넓이는 2,761㎡에 달할 정도로 광활하다.
1층 현관으로 입장해 오른쪽 충무실(다용도 공간)과 인왕실(연회장)을 둘러본 뒤 ‘레드 카펫’이 깔린 중앙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을 만난다. 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무궁화실(영부인 집무실)을 관람하는 코스다. 샹들리에 조명과 인왕실에 걸린 전혁림의 2006년 작 ‘통영항’이 눈에 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주요 방문자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던 장소에서 다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분주하다. 정면에는 한반도 모양의 ‘금수강산도’가, 천장에는 조선 시대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2층에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온다. 금색 봉황 휘장 앞에 놓인 대통령 책상을 보며 왠지 울컥했다. 공(功)과 과(過)의 논란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했던 지도자의 생(生)이 연민으로 다가온다. 집무실 크기는 168.59㎡(약 51평)로, 소규모 회의실을 겸하고 있다. 드넓은 집무실엔 늘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리라. 남모를 한숨과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이곳을 나오면 대통령과 외빈이 만나는 접견실이 나온다. 나무 창틀 문살은 한지로 마감했고, 벽면은 황금색 ‘십장생 문양도’로 장식해 한국적 미를 살렸다.
1층으로 내려가면 무궁화실이다. 영부인의 집무를 위한 책상과 접견을 위한 소파 등이 있고, 벽에는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김정숙 여사까지 역대 영부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비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다.
‘수궁 터’는 총독 관저가 있던 자리
아픈 역사 위에 순국 정신 세우길

본관 관람을 마치고 10분 정도 오르막을 따라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온다. 중앙 현관을 기준으로 대통령 가족만 쓰는 왼쪽과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나뉜다. 관람객들은 가장 오른쪽 방인 대식당부터 관람한다. 대통령이 초대한 손님들과 식사하는 공간이다. 거실에 놓인 벽난로와 낡은 피아노가 눈에 띈다. 양문형 옷장만 17개에 달하는 옷방, 작은 사우나 두 곳, 이발실과 당직실, 주방을 지나면 관람은 끝난다.
청와대는 건물뿐 아니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가 많다. 특히 상춘재 앞에 있는 ‘녹지원’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이다. 녹지원을 상징하는 소나무인 한국산 반송의 수명은 150여 년이며, 높이는 16m에 이른다.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로 가는 길에는 ‘수궁(守宮) 터’가 있다. 조선 시대 왕궁을 지키는 수궁(守宮)의 자리였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이 터에 총독의 관사를 지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 사령부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경무대,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됐다. 1991년 청와대 본관을 새롭게 건축한 후 1993년 11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수궁 터로 복원했다.
이제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6백 년 근현대사의 애환이 켜켜이 쌓여있는 거대한 근현대사 박물관에 순국선열추념관이 세워지길 바라본다. 그리하여 민족의 거룩한 순국 정신이 자랑스러운 민족혼으로 계승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