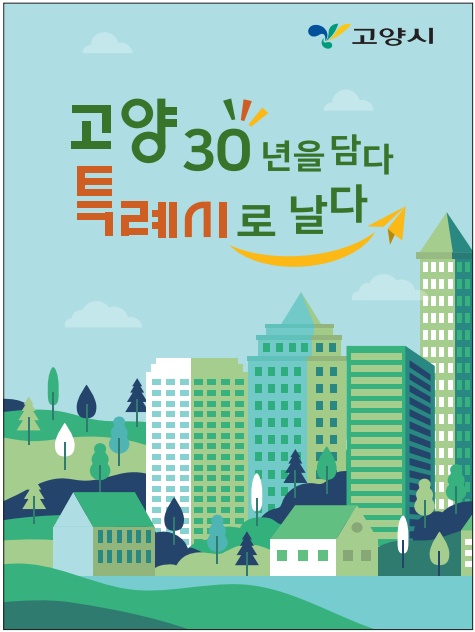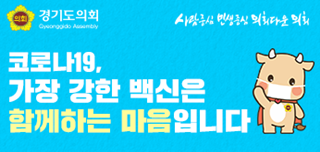한번 더 생각하는 역사 [2023/01] 망국(亡國)의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학
페이지 정보
본문
망국은 지배 계급의 실수로 빚어진 인재(人災)
‘탓의 역사학’ 벗어나 자성의 목소리 선행돼야
글 | 신복룡(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일제의 죄상 폭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는 그러한 식민지 점탈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이고 아픈 작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뼈를 깎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 교육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하지만 국사 교과서 어디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오(悔悟)가 보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무력으로’ 등의 어휘만이 보인다. 이 지구상의 어느 식민지 병합이 “합의에 따라,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가? 이러한 논지는 ‘탓의 역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탓의 역사학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우리의 역사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사의 진보론, 성선설(性善說), 신의설(神意說) 등 많은 이론이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의 역사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의 역사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살상을 위한 무기 개발·제조비는 의료비보다 많으며, 우리가 낭비하는 돈은 가난한 나라들의 절대 빈곤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보다 많다. 역사는 정의의 승리만은 아니었다. 그러한 불의가 국가 간에 나타난 것이 곧 전쟁이며 침략이며 병탄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침탈과 병합은 역사에 흔히 나타나는 재앙이었다.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한일 관계가 합병의 아픈 경험이 없었더라도 화친할 수 없었을 터이지만 오늘의 한일 적대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결정적인 이유는 한일합병의 유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대한(對韓) 감정이 혐오 의식인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적의(敵意)이다. 이 점은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점이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수행한 식민 통치의 가공할 잔인성과 비인간성, 그리고 그들이 이를 인정치 않는 데서부터 발원한다. 그것은 일본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곧바로 해외 팽창을 시도했던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다.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군국주의의 통치 엘리트는 대외적으로 최소한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치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朴明林)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제의 죄상 폭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는 그러한 식민지 점탈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것이 아무리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이고 아픈 작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뼈를 깎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 교육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망국의 원인에 대한 뼈아픈 회오(悔悟)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국의 기간에도 그 시대의 지식인들, 특히 역사학자들이 뒷날의 ‘광복의 역사’를 고뇌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 역사학이 민족의 해방을 전혀 전망하지 않기야 했을까만, 그 해방이 우리 역사의 어떤 단계가 되어야 하는가, 해방을 앞당기고 해방 뒤에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역사 교육을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나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해외에서 활동한 민족 해방 운동 전선의 일부 이론가들이 민족 해방이 역사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추구하려 노력한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탓의 역사학”의 함정
이와 같이 망국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는 한국의 일제시대사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한국의 일제시대사 연구는 일본의 잔학상을 강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사례로 고등학교 『국사』(하권, 2002, pp. 132~133)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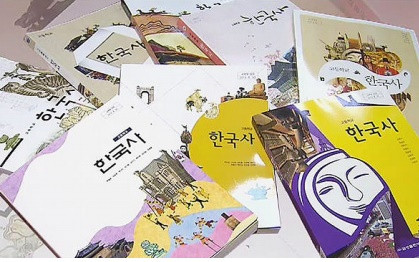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해 일방적으로 조약 성립을 공포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했다. 이에 고종 황제는, 자신이 조약 체결을 거부했으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국내외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으며,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거듭 밝혔다.(1907)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국내 정권을 장악한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동의 없이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정부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게 했다.
나아가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한 대한제국 군대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대한제국을 방위력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 그 후, 일제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주권 수호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사법권·경찰권을 빼앗은 뒤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했다.(1910)
이 글의 어디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오(悔悟)가 보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무력으로’ 등의 어휘만이 보인다. 이 지구상의 어느 식민지 병합이 “합의에 따라,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가? 이러한 논지는 ‘탓의 역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탓의 역사학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우리의 역사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망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광복이 자신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미화하고 과장한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글을 지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민족 문화를 보존·수호하는 한편,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항일 독립 운동은 1945년까지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로부터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등학교 『국사』 하권, 2020, p. 130)
이 글에 따르면, 한국의 독립은 자력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허구이며 사실이 아니다. 한 민족이 멸망하면서 한국처럼 무기력했고, 침묵한 민족이 흔치 않았다. 187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륙론자들이 정한론(征韓論)을 구체화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애국지사들에게는 참으로 송구한 말이지만, 일제 치하에서 항일한 투쟁의 내면을 미화하거나 과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끝내 우리의 힘에 의한 독립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망국에 이토록 침묵한 민족은 없어
이러한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2천만 동포가 한결같이 일제에 항거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자료와 겸허한 자세로써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일제 치하에서 2천만 동포가 일제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3·1운동의 비폭력 항쟁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세를 부른 사람의 수효는 전체 인구 1,678만 8,400명 가운데 2.76%인 46만 3,086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당시의 5년 동안인 1907년의 정미의병(丁未義兵)에서부터 합병 1년이 되는 1911년까지 조국을 수호하고자 무장 항전에 참여한 수효는 전체 인구 1천 312만 명 가운데서 1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항일참전율(抗日參戰率)은 1.1%가 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의 인구는 483만 명 정도였는데, 7년 동안의 전투에 참여한 총인원은 정규군과 의병을 합쳐 17만 명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의 항일참전율은 약 3.5%가 된다. 이와 같은 통계를 고려할 때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후의 대일참전율이 1.1%였다면 이 정도의 항쟁으로써 민족이 살아남기를 바랐다는 것 자체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한국의 대일항전은 그 강인성(强靭性)이나 강도의 측면에서 일본의 침략성에 비해 너무 나약했다.
당시의 한국인들은 국제 사회의 도덕률이라든가 무저항·비폭력 투쟁이 얼마나 환상적이며 이상주의적이었던가를 알았어야 한다. 세이뇨보스(Charles Seignobos)의 말처럼 약소 민족이 무장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할 가능성은 본래부터 희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멸망기의 항일 투쟁과 3·1운동은 무장 투쟁의 형식을 취했어야만 했으며, 이 점에서 김구(金九)의 테러리스트 항쟁[의열 투쟁]이나 신채호(申采浩)와 김원봉(金元鳳)의 무장 투쟁에 관한 주장은 옳았다. 왜냐하면 무장 투쟁은 민족 정기(精氣)의 문제이지 성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감상주의로부터의 해방이 필요
대일관계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민족감상주의가 차지했던 비중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민족감상주의는 민족을 응집시키는 일차적이고 부분적인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민족 의식이나 민족 운동을 끝까지 지속시킬 힘은 아니다. 민족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며 전략과 경륜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데, 대한제국은 이러한 점들을 소홀히 했고, 결국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어 멸망했다.
이러한 약점은 해방 80년이 가까워져 오는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제 시대를 체험한 기성 세대가 후대에 들려주는 “경험으로서의 일본관”은 아직도 감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역사학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텔레비전의 멜로 드라마나 담징(曇徵)·왕인(王仁)에 대한 나르시쿠스적 향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물론 대한제국이 멸망할 당시 우리가 겪은 제국주의 열강의 외압(外壓)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해진 그것과는 성격이나 강도에서 다른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 내재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던 점도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멸망이 역사적 필연이었거나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도 있는 비극이었다. 그것은 당시 지배 계급의 실수로 빚어진 인재(人災)였다.
내부식민지주의가 더 무서워
요컨대, 한국의 망국의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의 참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자신, 특히 당시의 지배 계급에 있다. 우리가 외세의 침략보다 더 경계할 것은 내부의 식민지주의이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나라 스스로가 멸망할 짓을 한 연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國必自伐然後人伐之)는 맹자(孟子)에게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필자와 출판사의 허락하에 『잘못 배운 한국사』(집문당, 2022)에서 발췌·수록하였습니다.

필자 신복룡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객원교수와 대한민국 학술원상 심사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그리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출판부장, 중앙도서관장, 대학원장,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분단사연구』, 『한국사 새로 보기』, 『한국정치사상사』, 『해방정국의 풍경』, 『전봉준평전』, 역서 『한말 외국인기록』(전 23권) 등 다수가 있다.